한국의 전통 농기구 모음
전통 농기구는 민속박물관에 가야 볼 정도로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겨레의 전통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어린이 홈페이지에는 전통 농기구를 사진과 설명및 그림으로 게시하고 있다. 보다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전통 농기구를 쓰임새별로 구분하여 일구기, 심기, 기르기, 들이기, 갈무리, 가내생산, 부록 등으로 나누어 한편씩 소개하고자 한다.
1. 일구기편

일구기는 일 년 농사의 가장 첫 단계 작업으로, 씨를 뿌리거나 심기 전에 땅을 가는갈이와 덩어리진 흙을 부수고 바닥을 판판하게 고르는 삶이로 나뉜다.
갈이란 농사지을 땅을 가는 일로 굳어 있는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작물의 뿌리가잘 내리게 해주고 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물과 양분이 잘 스며들게 해주는 일이다. 갈이는 농사를 준비하는 일이면서 가장 힘이 많이 드는 일이다. 가장 대표적인 갈이 연장으로는 동물의 힘을 이용하는 쟁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이용하여 쟁기를 끌었다. 쟁기를 쓸 수 없는 땅에서는 따비를 써서 사람이 직접 갈이를 하였다.
괭이, 화가래 등도 갈이에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경운기 등의 기계로 갈이를 하나, 비탈이 심한 땅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갈이 연장이 사용되고 있다.
갈이/ 삶이
따비

비탈이 심하거나 돌과 나무뿌리가 많아 쟁기를 쓸 수 없는 곳에서 땅을 갈 때 썼던 도구이다.따비는 쟁기보다 원시적인 형태이나,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도서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는 20세기 이후에도 사용되었다. 따비로 혼자서 하루에 150~200평의 밭을 갈 수 있다.
굽쟁기와 멍에

쟁기 길이 146cm │ 보습 길이 22cm 폭 21.5cm │ 볏 길이 36cm │ 멍에 길이 62cm
쟁기는 논밭을 갈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도구이다. 쟁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습으로 땅을 가는 역할을 한다. 갈린 흙을 한쪽으로 떠넘길 수 있도록 보습 위쪽에 볏을 달았다. 보습과 볏을 지탱하는 부분을 술이라 한다. 쟁기는 술의 모양에 따라 선쟁기·눕쟁기·굽쟁기로 구분된다. 굽쟁기는 작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가는 힘이 좋고 안전성이 뛰어나 19세기 말엽부터 유행했다. 쟁기로 하루 1000~1500평의 논밭을 갈 수있다.
볏과 보습

위 볏 길이 39cm 폭 27cm │ 아래 보습 길이 40.5cm 폭 33.5cm
보습
왼쪽 사진은 각 보습의 윗면이고 오른쪽 사진은 각 보습의 아랫면이다.

위 보습 길이 22.5cm 폭 19.5cm │ 아래 보습 길이 21cm 폭 12cm
겨리쟁기와 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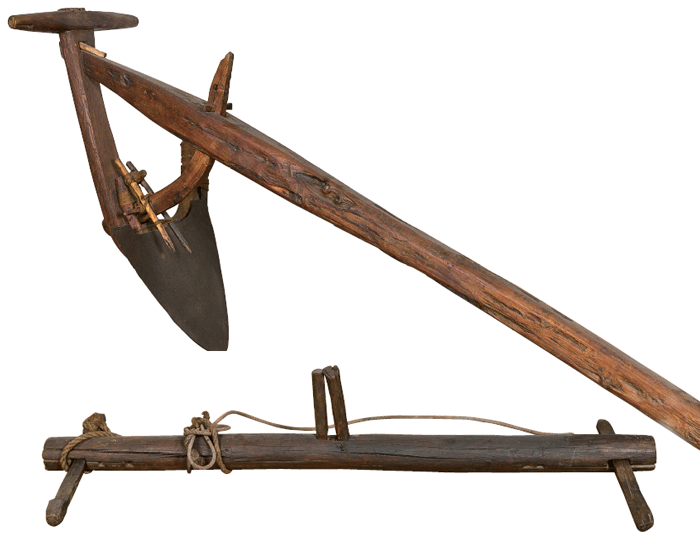
쟁기 길이 295.5cm │ 보습 길이 50cm 폭 49.5cm │ 멍에 길이 170cm
소 한 마리가 끄는 쟁기를 호리,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겨리라 한다. 겨리는 중부 이북산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비탈진 곳에서는 쟁깃밥이 저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겨리쟁기는 볏을 달지 않고 많이 썼다. 겨리쟁기의 멍에는 소 두 마리의 목에 걸어야 하므로 일반 멍에보다 길었다.
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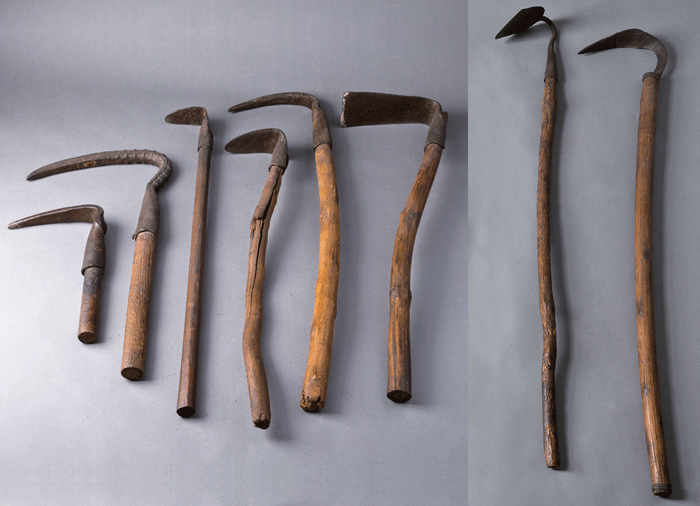
위 오른쪽 괭이 길이 74cm │ 오른쪽면 왼쪽 괭이 길이 127cm
단단한 땅을 파거나 일굴 때 쓰는 도구이다. 농사에서는 골을 켜거나 덩어리진 흙을 잘게 부술때, 또는 땅을 판판하게 고를 때 사용했다. 쇠날을 ‘ㄱ’ 자로 구부리고 짧은 쪽에 구멍을 만들어 나무 자루를 박았다. 토질에 따라 괭이 날의 길이와 폭, 자루와의 각도, 무게 등이 다르다. 괭이로한 사람이 하루 150여 평의 발을 일굴 수 있다.
화가래

왼쪽 화가래 길이 128cm
무논을 갈 때 사용하던 도구이다. 날 모양은 가래와 비슷하지만 괭이의 일종이다.
갈이/ 삶이
논밭을 간 후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을 삶이라고 한다. 삶이는 논이냐 밭이냐에 따라서 작업 방법과 쓰는 연장에 차이가 있었다. 논에서는 갈이가 끝난 논에 물을 대고 써레로 썬 후, 번지, 나래 등으로 바닥을 골랐다. 밭이나 물을 대지 않는 논에서는 평상써레나 곰방메로 썰고 번지나 나래는 거의 쓰지않았다. 쇠스랑과 발고무래, 가래 등은 다른 작업에도 쓰였지만 흙을 부수고 고르는데도 이용되었다.
써레

왼쪽 써레 몸통 길이 94cm │ 발 길이 10cm │ 위 써레 몸통 길이 190cm │ 발 길이 23.5cm
쟁기로 갈아놓은 흙덩이를 잘게 부수거나 땅바닥을 판판하게 고를 때 사용했다. 논에서는 모내기 전에 쟁기로 논을 갈고 물을 댄 후 써레질을 했다. 소 한 마리로 하루에 2000평의 논을 썰 수 있다.
평상써레

몸통 가로 57.5cm 세로 59cm │ 발 길이 29cm
써레의 일종으로, 몸통을 2~4개 잇대어 흙덩이를 보다 쉽게 부술 수 있도록 했다. 밭이나 물을 대지 않은 논에서 사용했다.
회전써래

몸통 가로 76cm 세로 81cm│발 길이 22cm
평상써레와 비슷한 구조이지만 틀 가운데에 발이 달린 굴대가 있다. 소가 끌면 굴대가 돌면서 흙덩이를 부수게 된다. 무논에서 사용했다.
쇠스랑

왼쪽 쇠스랑 길이 124cm
논밭을 갈고 써는 데 사용했다. 괭이와 달리 발이 여러 개 달려서 흙덩이를부수기에 좋았다. 쓰는 목적이나 토질에 따라 발의 수와 크기가 다르다. 쇠스랑으로 한 사람이 하루 1000평의 밭을 고를 수 있으며, 밭갈이는 200여평을 할 수 있었다.
곰방메

전체 길이 115cm│머리 길이 24.5cm 지름 6.5cm
쟁기로 갈아놓은 흙덩이를 두들겨 부수는 데 사용했다. 씨를 부리기전 이랑을 다듬고 씨를 넣은 다음 흙을 덮을 때도 썼다. 곰방메로 하루 500여 평의 흙을 부수고 고를 수 있었다.
발고무래

왼쪽 발고무래 전체 길이 123cm│머리 길이 74cm│발 길이 7cm
짧은 나무토막에 여러 개의 나무 발을 박은 것으로, 흙덩이를 고르거나 씨를 뿌린 후 흙을 덮을 때 사용했다.
가래

맨 아래 가래 전체 길이 246cm│가랫바닥 폭 25cm
흙을 뜨고 던지는 도구이다. 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진흙 밭이나 물이 많이 나는 논을 갈거나 고를 때 썼다. 이 밖에도 도랑을 치거나 논둑을 쌓고 깎을 때에도 많이 사용했다. 기다란 주걱 모양의 나무에 쇠의 날을 붙여 만드는데, 주걱 모양의 나무를 가랫바닥, 쇠의 날을 가랫날, 손잡이 부분의 나무를 ‘장부’라고 한다. 가랫바닥 양쪽에 구멍을 내어 줄을 맸다. 쇠가 흔해지면서 가랫바닥 없이 쇠로 삽 모양의 가랫날을 만들어 썼다. 한 사람은 ‘장부’를 잡고 흙밥을 뜨는데, 이 사람을 ‘장부꾼’이라고 했다. 가랫줄을 잡아당기는 사람은 ‘줄꾼’이라 했다. 장부꾼이 흙밥을 뜬 후 줄꾼이 가랫줄을 잡아당겼다 놓으면 흙이 날아갔다. 3인이나 5인, 7인이 한 조가 되어 작업했다.
출처: 농촌진흥원 어린이 홈페이지
홈 > 농업동산 > 농기구 이야기 > 한국의 전통 농기구
https://www.rda.go.kr/children/pageUrl.do?menu=agri&pg=0203#none
농촌진흥청 어린이 홈페이지
한국의 전통 농기구
www.rda.go.kr
'전통문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가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 (0) | 2022.04.29 |
|---|---|
| 따스한 봄날, 꽃나무 아래 햇볕을 즐기는 강아지들 (0) | 2022.04.06 |
| 농기구의 구조와 명칭 (0) | 2022.04.04 |
| 지켜온 열정 숭고한 나눔 (0) | 2022.04.02 |
| 해월 황여일(海月 黃汝一) (0) | 2022.04.01 |



